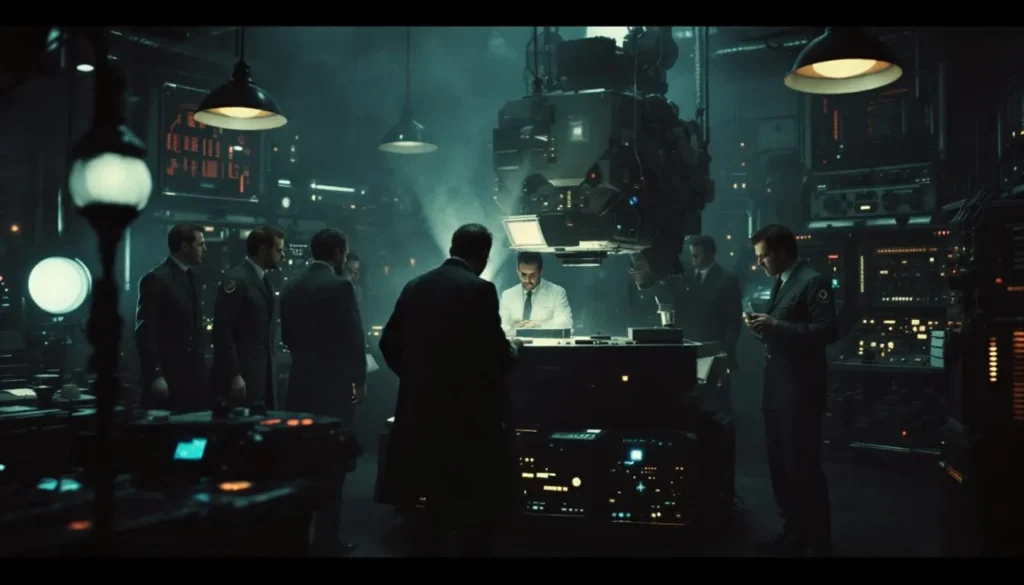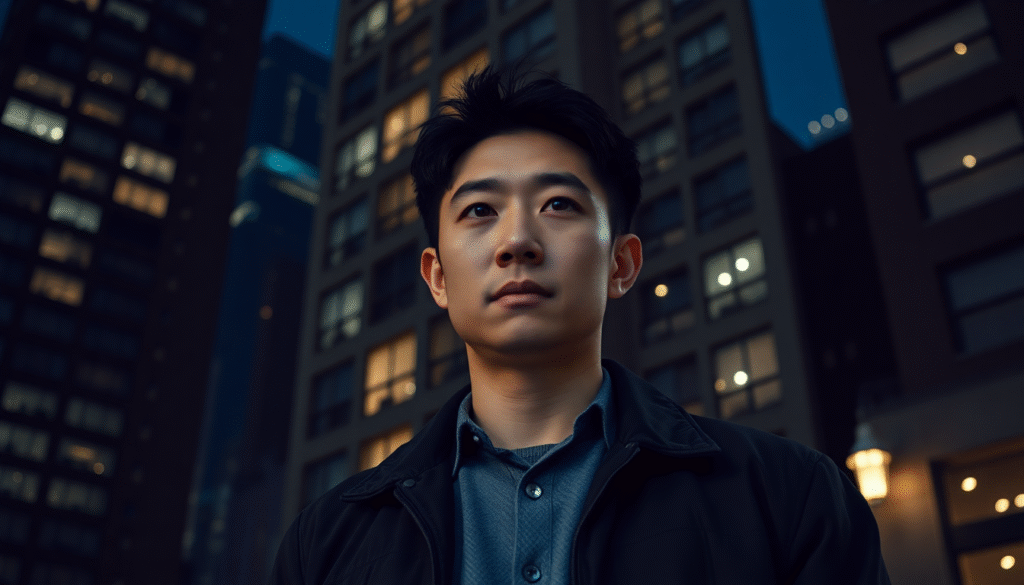1986년 9월 15일 밤. 경기도 화성 태안읍의 들판이었다. 밭두렁 인근에서 결박된 여성이 발견됐고, 마을의 정적은 균열을 냈다. 현장은 비가 그친 뒤였다. 흙은 질었고 발자국은 번져 있었다. 수거된 증거는 스타킹 조각, 거친 매듭, 미량의 체액뿐이었다.
도시는 멀었고 기술은 더 멀었다. 그 무렵 한국의 과학수사는 혈액형, 지문, 섬유 비교에 머물러 있었다. DNA 감식은 교과서 속 신기술이었고, CCTV나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사의 축은 탐문과 매복, 그리고 감각이었다. 형사들은 우편배달부의 동선과 농로의 발자취를 외웠고, 야산의 북쪽 사면이 더 젖는다는 사실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진짜 상대는 익명의 패턴이었다. 피해자들은 10대에서 70대까지로 넓었고, 흩어진 장소는 논두렁과 배수로, 저수지 둑이었다. 도구는 즉석에서 구한 끈과 의류였고, 매듭은 반복됐다는 점이 공통점이었다.

첫 사건 이후 간격은 점점 교묘해졌다. 1986년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며 2, 3차 사건이 이어졌고, 1987년과 1988년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이 이어졌다. 밤비가 오면 농로는 조용해졌다. 그 틈이 노려졌다. 경찰은 병력을 쏟아부었다. 연인원 200만 명을 넘겼고, 관할과 관할의 경계까지 새로 그었다. 용의자는 2만여 명에 달했다. 지문과 혈액형 감정은 수만 건을 넘었고, 읍내의 버스정류장마다 전단이 붙었다. 그러나 수사는 늘 같은 벽을 만났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다. B형이라는 혈액형 정보가 나왔지만, 그 정보는 가이드일 뿐 식별자는 아니었다.
사회는 공포를 배웠다. 붉은 옷을 입지 말라는 괴담이 돌았고, 해가 지면 길이 비었다. 학교는 하교 시간을 당겼고, 동네는 자율방범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공포는 예측을 낳지 못했다. 범행 간격은 불규칙했고, 시야를 넓히면 범인의 그림자는 더 옅어졌다. 당시 수사에는 범죄심리 프로파일링이 사실상 부재했다. 패턴의 형태는 보였지만, 범인의 생활반경과 심리 지표를 체계화할 인프라가 없었다. 수사서는 두꺼워졌고, 카드식 파일은 넘겨도 넘길 페이지가 남았다.

8차 사건은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1988년 발생한 그 사건에서 한 남성이 범인으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그의 이름은 윤성여였다. 그는 강압과 가혹행위 속에 자백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장기간 수감생활을 했다. 비극은 기술의 빈곤만이 아니었다. 제도의 압박과 실적의 논리가 한 사람에게 무게를 얹었다. 기록은 쌓였지만 진실은 멀어졌다.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의 사건은 재심으로 뒤집혔다. 2020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당시 수사의 위법성과 한계를 확인했다.
시간은 흘렀고 공소시효는 더 빨리 흘렀다. 2006년 4월, 마지막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사건은 미제로 공식화됐다. 그해 봄의 날짜는 한 장의 문처럼 닫혔다. 피해자들의 이름은 기록에서 숫자가 됐고, 유족의 시간은 멈춰졌다. 그러나 사건은 법을 움직였다. 중대 강력범죄에서 시간 제한의 정당성이 흔들렸고, 장기 미제의 교훈이 축적됐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기술이 뒤늦게 도착해도 정의가 멈추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그 사이 기술은 자랐다. 1990년대 후반 PCR과 STR 분석이 보편화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량이 확장됐다. 보관된 증거물은 재분석의 대상이 됐다. 2019년, 낡은 봉투가 다시 열렸다. 속옷과 의류의 미세한 얼룩에서 DNA가 검출됐고, 데이터베이스의 프로필과 일치가 떴다. 일치한 인물은 이춘재였다. 그는 1994년에 저지른 또 다른 살인으로 이미 수감 중이었다. 재분석 결과는 사건을 현재로 데려왔다. 경찰은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그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10건을 포함해 총 14건의 살인을 자백했다. 자백은 장소, 동선, 매듭의 방식, 접근과 이탈의 루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증 결과 다수의 진술은 현장 기록과 부합했다.

자백의 여파는 오래된 오류를 꺼냈다. 그는 8차 사건에 대해 범행을 부인했고, 재심은 그 부인을 간접증거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잘못된 수사를 고쳐 세우는 과정에서 경찰은 공식 사과를 했다. 증거 보관과 재분석 절차는 표준화됐다. 체액과 섬유의 장기 보관 지침이 개정됐고, 조서 중심의 수사 관행에서 감식 중심의 방식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DNA 데이터베이스의 운용은 확대됐고, 채취·활용의 법적 견고함도 강화됐다. 사건의 그림자는 제도의 형태를 바꿨다. 시간은 범인을 돕지 못하게 됐다. 증거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말해주게 됐다.
이 사건은 몇 가지 해석을 요구했다. 첫째, 기술 격차가 정의의 공백을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증거는 있었지만 읽는 법이 없을 때 정의는 정지됐다. 둘째, 수사 자원의 양이 곧 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이었다. 방대한 탐문과 총력 투입이 패턴의 의미화를 대신해주지 못했다. 셋째, 인권과 효율의 균형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이었다. 잘못된 자백은 진범의 시간을 연장했고, 공동체의 신뢰를 깎아냈다. 마지막으로, 증거의 보존이 역사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이었다. 봉투 하나가 열렸고, 도시는 30년 전의 밤으로 돌아갔다.

가끔 역사는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늦은 도착이 무의미하지는 않았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범죄수사와 법제, 그리고 기억의 체계를 동시에 바꿨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고, 증거 보존과 DNA 감식의 표준이 정비됐다. 잘못된 유죄는 바로잡혔고, 기관의 사과는 기록으로 남았다. 중요한 교훈은 단순했다. 과학은 모자랄 때 위험했고, 남아 있을 때 구원이었다. 증거는 침묵하지 않았고, 제도는 그 침묵을 듣는 법을 배웠다. 들판의 바람은 멎었지만 기록의 바람은 불었다. 오래된 어둠을 통과한 뒤, 정의는 늦게라도 도착해야 정의였다.